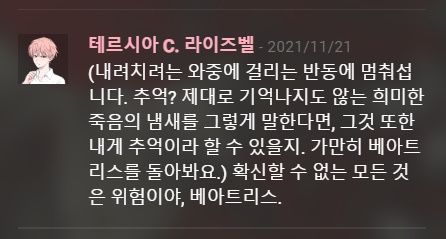
새로운 헬레니아를 만드는 것보다 기울어진 헬레니아를 세우는 것이 더 번거로운 일이었다. 다 무너진 애셜가의 청년 덕에 차츰 돌아가고 있지만. 오늘따라 유독 길어진 업무를 뒤로하곤 말에 올라타 다시 푸르러진 풀들을 스치며 지나갔다.
오늘은, 아니. 어쩌면 오늘도? 모래 가득한 어느 곳으로 곧장 달려나가 해가 저물고 달빛이 창문에 걸린 방으로 들어갔다. 오늘은 귤이라도 사 갖고 와주려나. 그런 생각과 함께 귤향이 퍼졌다. 시선을 돌리면 탁자 위에 놓여진 바구니 속의 귤…. 귤?
다시 시선을 돌리면 열려있는 창문, 흔들리는 커튼. 그리고 그 아래 눈을 감고 있는 샤샤가 보였다. 그럴리가 없는데. 아니, 그렇지만 당신의 별장이니 당연한 건가.
"샤샤, 잠들었나요?"
샤샤의 눈 위로 조심스레 손바닥을 내보이며 휘저었다.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는 게, 꼭 태엽이 감기지 않은 인형 같았다.
당신도 꿈을 꾸고 있을까,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아아, 평온한 표정으로 누워있으니 적어도 악함에 쫓기고 있지는 않으려나.
만에 하나 당신이 지독한 꿈을 꾼다면, 그 순간 내가 당신 곁에서 눈을 뜨고 있을게요. 내가 대신 앗아갈게요. 그러니 적어도 당신은 내 꿈을 꾸지 말기를.
"창문 열어두고 자면 감기 걸려요?"
창문 사이로 바람이 불었다. 솜사탕같은 머리칼이 긴 속눈썹을 가리며 흐트러지는 것을 바라본다. 감은 눈꺼풀 위로 덮인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쓸어 넘겨주었다.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을 자세히 보는 건 처음이었다. 그도 그럴게, 샤샤가 자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으니.
누운 샤샤의 모습이 어쩐지 낯설어 보이기도 하다. 이렇게나 어깨가 넓었던가. 이렇게나 손가락이 길었던가.
분명 처음에도 이런 호기심. 호기심이었다.
샤샤를 처음 본 날에는 무수히 많은 처음이 있었다. 처음으로 어른의 말을 어기고 방에서 나온 날, 처음으로 많은 귀족들을 보게 된 날, 처음으로 본 분홍색 머리칼.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먼저 말을 걸었던 날. 샤샤는 나의 무수한 시작점이자 마지막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대담했던 날이었음에도, 세상이 온통 흐트러지고 선명하게 샤샤만 존재하는 시간만 떠오른다. 어쩌면 이것도 사랑일지도 모른다.
두번째로는 동경.
캄캄한 어둠속을 헤매는 사람에겐 길잡이가 필요한 법이었고, 내게 있어서 길잡이는 샤샤였다. 책으로 읽고 노래로 배운 희망은 작고 연약했지만 샤샤의 손으로 이끌어져 봐 온 것들은 나를 지켜주었다. 순진하게 피어 올린 물음들이 잘 버려진 칼날이라는 것도 일러주었다.
샤샤를 좇으면서 완벽한 행복을 느꼈다. 마음을 준다는 것, 시간을 준다는 것, 추억을 준다는 것, 약점을 준다는 것, 새벽을 준다는 것. 접었다가 편 자국에 다른 흔적을 남기는 것. 길 한 쪽을 내주며 알려준 것들이었다. 샤샤 앞에서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고 싶었다. 샤샤가 나를 채워주기를 바랐다. 이 모든 과정이 완벽한 행복이 될 수 있었다.
언젠가 무너지는 당신을 보고 느낀 건, 그래. 살면서 겪을 뼈저린 아픔이라면, 꼭 흘릴 눈물이라면, 시릴 정도의 고통이라면, 함께 받아 서 다 헤쳐나갈 수 있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신도 무너지는데. 내가 안 무너질 수 있겠어요.
그다음은 죄책감이었던가.
라이즈벨 혹은 테르시아로밖에 부를 수 없었다. 내 호흡이 흐트러질 정도로 엉망인 감정으로 바라보았다. 나에게서 떨어지기를, 나를 증오하고 원망하기를, 그래서 나를 밀어내기를. 그렇게 생각할수록 시선도 마음도 샤샤에게로 낙하했다. 속수무책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처절함 속에서도 멈출 수 없는 감정의 목적이 샤샤였음을 직감했고, 그것은 무너져 내릴 날들을 기꺼이 짊어질 수 있게 하였다. 사람은 감정에 굴복하고야 마는 순간이 온다. 그것이 얼마나 옥죄어 오든, 살아야 한다. 살아야 했다. 살아서 사랑스러운 이름을 맘껏 불러야만 했다. 아주 조금이라도 나를 증오하고 있을 당신을 위해서. 여기까지가 나의, 사랑하기 이전의 감정들이었다.
내가 사랑이 뭐냐고 물어봤죠. 지금은 내가 말할 수 있어요. 그 어떤 것에도 이유가 될 수 있는 게 사랑이라고. 내가 길치인 건, 샤샤와 헤매이다가 문득 보는 낯선 풍경들이 행복해서. 내가 굳이 지도를 보지 않는 건, 밤늦게까지 함께 헤매이다가 문득 보는 밤하늘의 별이 아름답게 빛나서. 그 헤매임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 내겐 샤샤라서.
거 봐요, 나는 여전히 불확실한 당신을 원해요. 당신이 필요해요. 내게 웃지 않더라도 다정하게.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다정하게 낡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 샤샤, 내게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 말아 주세요. 내가 사랑한다 말하더라도 대답하지 말아 주세요. 이 말의 뜻을 알기 전까지는 더더욱.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에게 샤샤는 생각보다 커서 내 여백을 채우고도 남을 것이다. 그거 알아요, 샤샤? 이런 삶도 동화라면, 샤샤로 인해 내 인생은 좋은 책이 될 것 같아요.
"샤샤의 책에도 엄청나게 끌어안고 싶어지거나 그런 것이 담겨져 있을까요."
"안고 싶어?"
익숙한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아."
희미하게 벌개진 얼굴이 시선 끝에 걸려 깜빡인다. 기나긴 공백 속을 휘적이다가 그조차도 균형을 잃고 샤샤의 몸 위로 미끄러져 내렸다. 금방이라도 닿을 듯 가까워진 거리감에 희미하게 느껴지는 맥동은 지나치게 빨랐다. 스스로도 열감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더 감고 있어줘?"
"아, 아뇨. 안 그래도 돼요."
금방이라도 이불 속에 파묻히고 싶은 마음으로 샤샤의 목을 팔로 둘러감곤 얼굴을 숨겼다. 되려 숨겨지지 않을 걸 알고 있지만.
샤샤는 자세를 좀더 편하게 한 뒤 다시 내려앉곤 아까의 혼잣말에 대답이라도 하듯 입을 열었다.
"네가 보고싶어서 비를 맞을 정도야."
"나는 하루종일 당신을 껴안고 싶을 정도로 좋아해요."
"빌린 동화책이 연체될 때까지 숨겨줄 수 있을 정도로."
"…업무를 내려두고 같이 대화하고 싶을 정도로 좋아해요."
"네가 내 펜을 뺏어갔으면 하는 정도로."
"……샤샤, 지금 나 놀리는 거죠?"
"농담 아니야."
그저 내던져 짓밟으려던걸 당신은 달콤하게 웃으며 내 눈앞에 흔들어 보였다. 나는 언제나 샤샤에게 약했다. 내가, 뭘 어쩌겠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웃음을 내보이며 설득당한 척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해요. 사랑하고 있어요."
샤샤,
이 말에는 대답하지 말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나는 가끔 하려던 말을 숨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답하지 말라는 말 뒤에는……
다른 말을 하고싶었던 걸지도 모르지요.

'TRPG > LOG'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블러디메리캐슬] 잘 자요, 좋은 아침! (0) | 2022.11.23 |
|---|---|
| [블러디메리캐슬] 러브러브 대작전! (0) | 2022.11.06 |
| [블러디메리캐슬] 태양을 쟁취하고 와 (0) | 2021.12.22 |
| [병실즈] 세상의 별이 될 아이들 (2) | 2021.12.11 |
| [블러디메리캐슬] 너는 나를 닮았어 (0) | 2021.12.11 |



